 |
| ▲ 최근 한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의 기세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 규모나 값 싼 노동력 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적혁신을 통해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기로에 선 것이다. (사진_pixabay) |
‘제조업 강국 코리아’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성장률 다른 나라에 비해 감소 폭이 낮았고, 수출 증감률 역시 회복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장과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의 기세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임금 국가의 추격, 기술 장벽이 높은 선진국 사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우려가 있어 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지해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 규모나 값 싼 노동력 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적혁신을 통해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기로에 선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GTC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적자원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24위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기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1위였으나 인적자원 경쟁력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혁신을 위한 재교육, Up-skilling보다 직접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기술발전과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 가속화되는 변화의 시기에 인적자원 혁신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거나 작업 절차 개선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 한독 비교’ 분석에서 한국과 독일의 생산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생산직과 기술직 사이의 차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주로 한국과 독일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_pixabay)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9월 15일 ‘KRIVET Issue Brief’ 제241호 ‘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 한독 비교’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생산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가 2018년 실시한 직무수행을 위한 숙련 요건에 대한 ‘Employment Survey’ (총 1085명 조사)와 동일한 설문 구조와 설문 문항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8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수행됐다.
이 분석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빈도는 독일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새로운 과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중은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직이 41.9%, 대기업이 33.0%로 나타나 독일의 중소기업(2.7%), 대기업(2.6%)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기술직도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의 발생 빈도가 독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68%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1.1%, 대기업은 7.4%밖에 되지 않았다.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자주 시도해야 할 경우도 독일이 한국보다 많았다. 작업 절차 개선이나 새로운 방법의 시도가 전혀 없는 비중은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직에서는 40.9%, 대기업 생산직에서는 30.8%로 많지만, 독일은 약 6% 내외였다.
생산직에서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 기업에서는 30% 내외로 많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0.7%, 대기업이 3.3%로 거의 없는 편이다.
기술직에서 새로운 작업 절차나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의 중소기업에서는 55.8%, 대기업에서는 51.3%나 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3.4%, 대기업에서는 14.8%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였다.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일해야 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크게 떨어졌다. 생산직에서 역량의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의 중소기업에서는 11.8%, 대기업은 12.4%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0.2%, 대기업에서는 0%였다.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역량의 극한까지 끌어올려 일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비중은 독일의 중소기업 32.6%, 대기업 35.1%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7%, 1.1%밖에 되지 않았다.
또 독일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국은 주로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생산직은 7.7%, 대기업 생산직은 12.1%이고, 중소기업 기술직은 8.0%, 대기업 기술직은 14.8%로 낮았다. 반면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비중은 중소기업 생산직이 35.7%, 대기업 생산직은 48.4%이고, 중소기업 기술직은 28.4%, 대기업 기술직은 40.7%로 낮지 않았다.
이에 비해 독일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기술직은 89.5%, 대기업 기술직은 94.3%로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직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비중이 60%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선진 제조업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긴밀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인적자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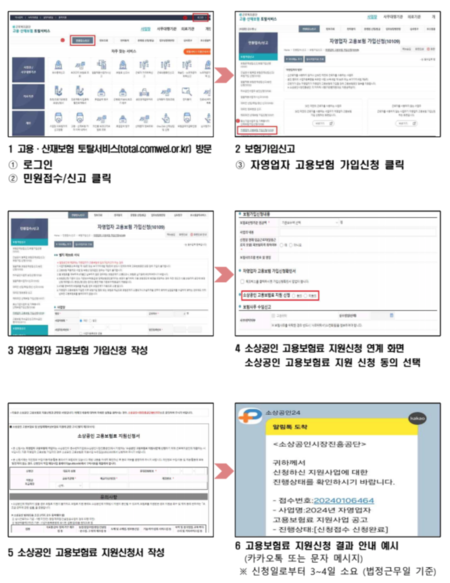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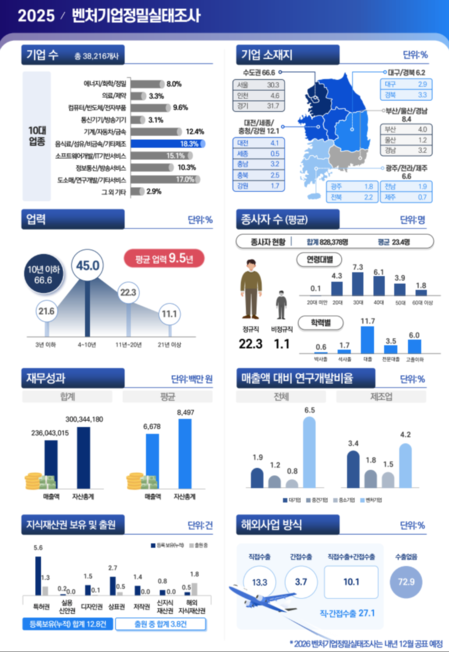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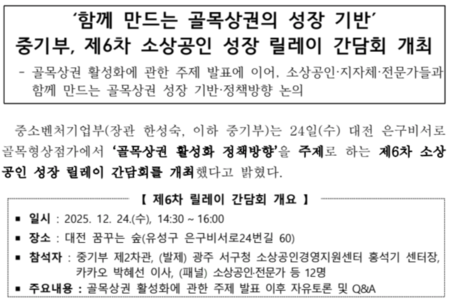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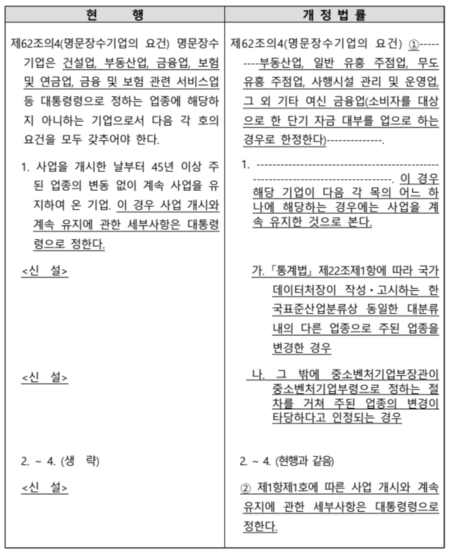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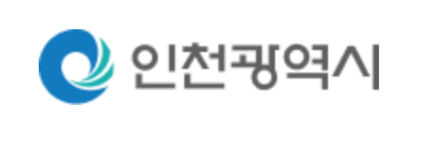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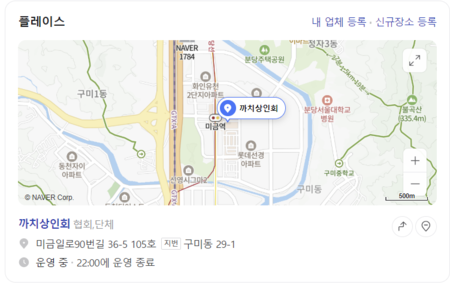
























![[소상공人줌] 대물 조개전골의 성공 신화, 박태현 대표의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여정](/news/data/20240227/p1065617231770938_699_h2.jpg)
![[청년창업人] 삶의 빈 공간을 커피와 요리, 커뮤니티로 채우다](/news/data/20240216/p1065623134093441_387_h2.jpg)
![[청년창업人] 플틴의 혁신, 단백질 음료로 건강과 맛을 재정의하다](/news/data/20240214/p1065604873523031_437_h2.jpg)
![[匠人 줌인]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 새벽감성1집 김지선 대표의 이야기](/news/data/20240112/p1065619773312488_227_h2.jpg)








